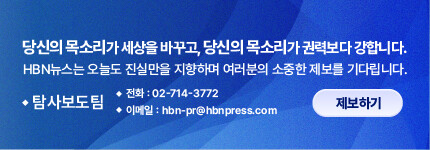국회·금융당국 대책 내놓지만 미비, 현실적 제도 개선 시급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금융권의 지급정지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선의의 계좌 명의인의 금융생활까지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답답함은 여전하다.
1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계좌는 15만 개를 넘었다.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며, 올해 1분기만 해도 1만 개 이상의 계좌가 정지됐다. 지방은행 역시 5년여간 9600여 개 계좌가 정지되는 등 상황은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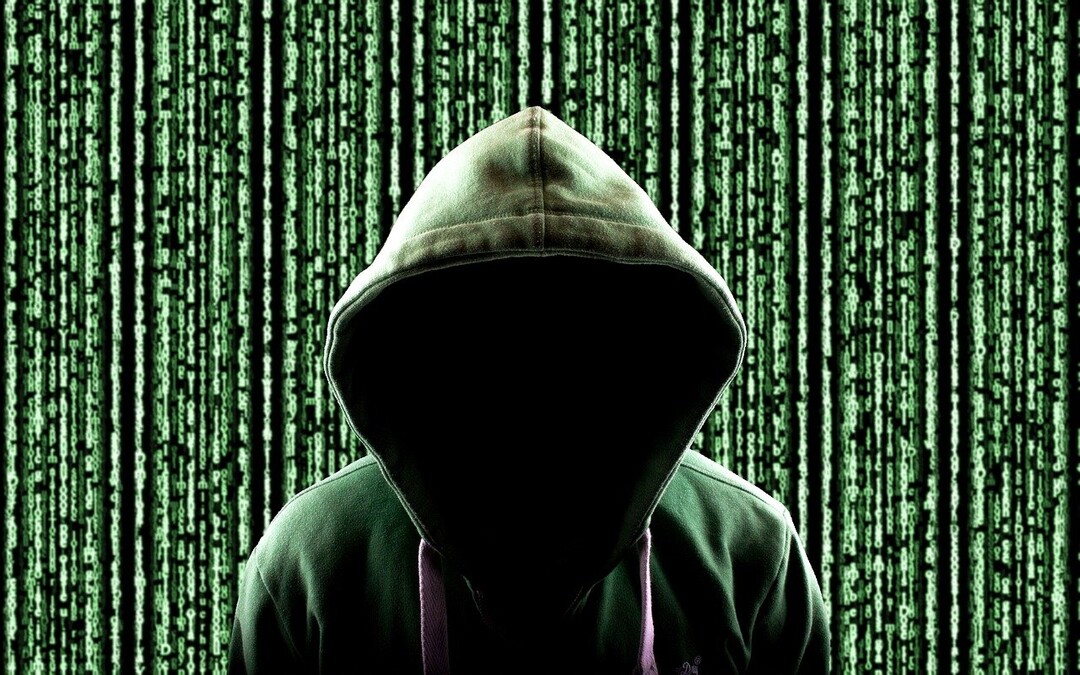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해당 계좌 전체를 즉각 지급정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피해금이 소액이어도 수천만 원 이상 잔고가 있는 계좌까지 전면 정지되고, 카드 결제·공과금 납부·생활비 이체 등 기본 금융활동까지 중단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고의로 타인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피싱 테러’식으로 계좌를 정지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선량한 계좌 소유자가 하루아침에 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동시에 금융생활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선의의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일을 직접 당해봐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피해자들은 ‘부분 동결 제도’나 ‘사전 통보 및 선택권 부여’ 같은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속한 피해 차단 필요성을 이유로 “장기 검토 과제”라며 미뤘다. 대신 지난해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들어 “일부 지급정지는 이미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회 역시 올해 안에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사 책임 강화를 예고했지만, 세부 요건과 절차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허위 신고·도덕적 해이 우려만 반복될 뿐, 선량한 계좌주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명의인의 금융활동을 최소한 보장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부분 동결 제도와 사전 안내 시스템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생활 피해를 줄일 현실적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당국과 국회는 여전히 ‘피해 차단 속도’와 ‘배상 책임 범위’ 논쟁에 매달려 있다. 정작 중요한 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데는 미흡한 모습이다.
“범죄자는 잡히지 않고, 피해자는 금융사가 대신 배상한다”는 제도 개선 허울 속에서, 선량한 계좌 소유자의 생계가 무너지는 구조는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는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는 피해자와 선의의 금융소비자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