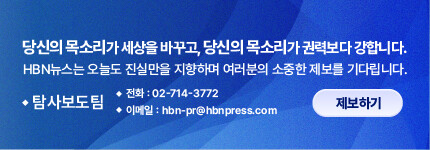대면적 인터포저·기판 생략, 패키징 혁신 중심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미세공정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칩의 미세화와 대형화만으로는 더 이상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의 해법을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패키징 혁신이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다.
22일 KB증권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는 오랜 기간 공정 미세화와 집적도 향상에 사활을 걸어왔다. 하지만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수율 저하와 공정 비용 폭증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리더들은 패키징 기술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시스템 성능 극대화와 생산성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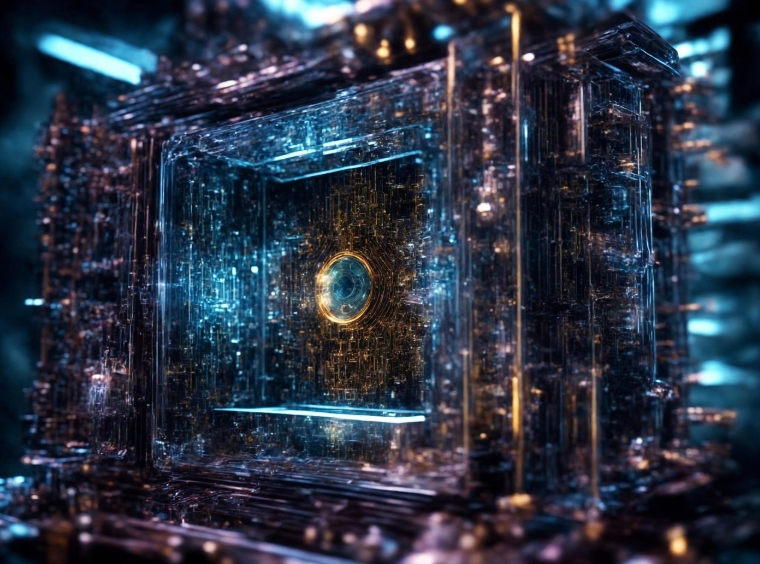 |
| 미래 반도체 상상도 [자료=픽사베이] |
최근 패키징 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대면적 인터포저’와 ‘기판 생략’이다. 고성능 AI, HPC(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맞춰, 여러 칩(칩렛)과 메모리, 고속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패키지에 고집적으로 집적하는 대면적 인터포저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는 칩렛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다양한 칩을 인터포저 위에 집적하는 CoWoS(Chip-on-Wafer-on-Substrate) 계열 기술을 확대 적용 중이다. 이는 칩 간 초고속 연결과 대역폭 극대화, 발열 분산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2027년 도입 예정인 TSMC의 SoW-X는 웨이퍼 자체에 RDL(Redistribution Layer)을 활용, 여러 칩과 메모리, 광통신 인터페이스를 직접 결합하는 기판 없는 패키징 방식을 구현한다. 이는 기존 패키지 기판이 담당하던 역할을 웨이퍼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집적도·전력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브리드 본딩, HBM 패키징의 미래
메모리 패키징 분야에서도 혁신이 이어진다. 기존 TSV(실리콘 관통 전극)와 마이크로 범프 방식 대신, 칩 간 구리-구리(Cu-Cu) 직접 접합으로 층간 연결을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I/O 밀도를 대폭 높이고, 열 방출 및 전력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업계는 HBM4(16단)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며, HBM5(20단)부터는 사실상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이미 16단 HBM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시제품을 공개했으며, 2026~2027년 상용화가 예상된다.
◆ 첨단 패키징,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연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첨단 패키징(플립칩, 하이브리드 본딩 등)의 비중은 2022년 47%에서 2028년 77%로 급증할 전망이다. 메모리 패키징 시장 역시 연평균 13%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8년에는 4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AI, 고성능 컴퓨팅, 차세대 서버 등에서 초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첨단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논리칩과 메모리, 광통신 등 이기종 소자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패키징 장비·소재·설계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미세공정 기술에만 있지 않다.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혁신의 중심에 서면서, 산업의 지형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 패키징 기술은 미세공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5년, 패키징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내다봤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