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사례 통해 배우는 우리 정부의 과제
Q: 은행과 거래소 간 실명계좌 계약이 왜 독점적 구조를 만드는 건 가요?
A: “은행들은 거래량·위험 등 기준으로 계약 거래소를 선정해요. 대형 거래소와만 계약하면 중소 거래소는 원화 기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를 결정’하는 상황이죠.”
Q: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A: “제3의 기관이 중재하거나, 최소 진입 요건을 갖춘 모든 거래소에 자동으로 실명계좌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거래소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위 내용은 국내금융 정책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독과점’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 3월 23일, 업계 1·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의 98%를 장악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제 논의에 나섰다.
 |
현재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약 53%, 빗썸은 41%, 코인원은 4.2% 정도다. 이 세 거래소가 사실상 국내 원화마켓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예수금, 매출, 수수료 수익 면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밀 분석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는 반발이 거세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플랫폼을 선택한 결과일 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는 전혀 없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비트와 빗썸은 거래량이 많아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코인을 원화로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린 측면이 있다.
이처럼 대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데에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을 위해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재 시중은행들은 주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등 대형 거래소에만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신규 투자자 유입이 어려워졌고, 결국 시장이 대형 거래소 위주로 재편됐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정치권이 공정거래법과 금융규제 강화를 언급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장 지배력 남용’ 사례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구체적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와 자유시장 원칙 간의 충돌이다. 업계는 “무리한 규제는 시장의 혁신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소수 거래소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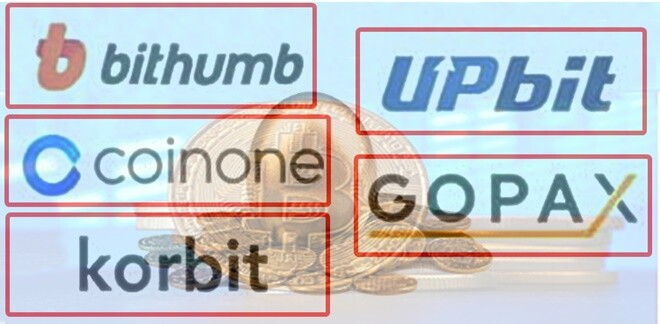 |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소-은행 독점 계약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거래소와 특정 은행 간의 독점 계약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독과점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업계의 판도뿐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환경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칼날이 업계의 혁신을 꺾을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편에 계속...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